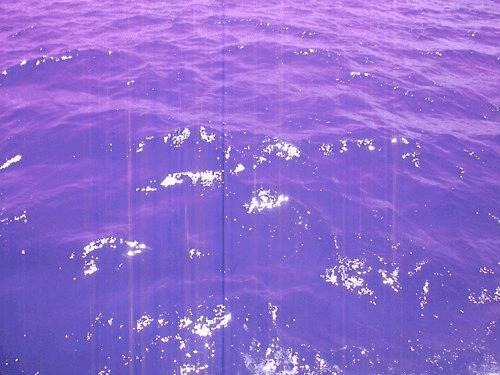sempereadem;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서문 본문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며,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데,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은 별들이 발하고 있는 빛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3년 전 한국 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교수님이 읽어주셨던 ‘소설의 이론’ 서문 당시 저 말이 너무 좋아서 바로 도서관에 가서 루카치 <소설의 이론>을 대여했다. 그러나 번역가가 달라 교수님이 보여주신 저 멋드러진 문구의 서문은 발견할 수 없었다. 번역도 딱딱하고 .. 분명 논리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아 더 읽지 않았다. 저 서문은 번역가마다 다르다. 아무튼 , 저 시대로 우리는 다시는 회귀할 수 없기 때문에 닿고 싶어하고 회귀본능이 있다 이런 맥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전의 세대에게 루카치는 필독서와 같았다는 것만 알고 거기서 멈췄다.
그 해 예종에서 면접 봤을 때 교수님이 나한테 “요즘 애들도 루카치를 읽나?” 라고 물어봐서, ‘그건 잘 모르지만 나는 읽었다’ 고 대답했다. 그 표정은 오묘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었다. 아무튼 그 해 시험에선 낙방했다. (이 질문은 막바지에 그냥 진짜 신기하다는 투로 물어본 것이라 나의 대답이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교수님의 수업이 그립다. 단편 소설들을 읽어나가고 매주 서 평을 쓰고 토론을 하고, 사람들과 발표를 했던 나름 빡센 수업이었지만. 코로나로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그런가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 재밌게 들었던 수업들이 그립다.
그 수업을 통해서 나를 구성하는 기억의 편린들을 되짚어 보았었다. 그리고 문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반전으로 나는 예종 시험과 기말이 겹쳐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다. 학교 도서관에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이 닥쳐와 급하게 희곡 공부를 하느라 기말 시험을 안봤다. 7과목인가 8과목 들었나 아무튼 이론 강의만 오질나게 듣던 학기였는데 시험을 하나도 안보러 가서 학점 다 조졌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수님이 전화 오셨다. 나보고 실수하는 거라고 한번만 봐준다고 시험 응시할 기회를 주신 감사한 교수님. 현재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다. 김승옥 작가를 연구하시던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자교 출신이셔서 그런지 학생들에게 애정있으시고 열정 넘치셨던 분인데.. 감사한데 염치가 없어 연락을 못드리겠다. 연극 평론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하 ^^;; 얼굴이 더 두꺼워지면 한번 연락 드려봐야겠다.
공연을 준비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모르는 것들의 한계를 더 강하게 느낄 테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채워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전에 다니던 러시아 학과의 교수님들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교를 자퇴해버린 것이 조금 후회스러웠다. 특히 사회학 교수님 수업이랑 스터디는 두고두고 생각해도 재밌었다.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러시아나 고려인을 다루는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