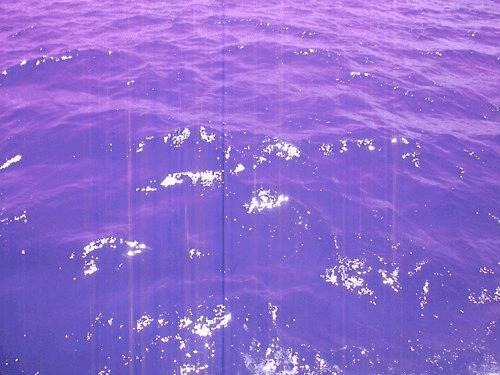sempereadem;
몰락의 에티카 , 신형철 본문

2019.04.18
문학은 불가피하다.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말과 행동이 형편없는 불량품이기 때문이다. 말이 대게 나의 진심을 실어나르지 못하기 때문이고 행동이 자주 나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가장 친숙하고 유용해야 할 수단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개별자의 내면에 '세계의 밤'(헤겔)이 혹은 '죽음충동'(프로이트)이 있기 때문이다. 부분 안에 그 부분보다 더 큰 전체가 있다는 역설, 살고자 하는 것 안에 죽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하고 있다는 역설 때문이다. (내가 부정해야만 하는 혹은 나를 부정할 드는 '그것'을 독일관념론과 정신분석학에 기대어 자기-관계적 부정성 이라 부를 수 있다.) 덕분에 말은 미끄러지고 행동은 엇나간다. 과연 나는 내가 아닌 곳에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캉).그러니 내 안의 이 심연을 어찌할 것인가. 그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신경증)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사랑하노라.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달리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을.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몰락한 자들에게 매료되곤 했다. 생의 어느 고비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혹하게 아름다웠다. 왜 그랬을가.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인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빈 채로 가득 차 있었고 몰락 이후 그들의 표정은 숭고했다. 나를 뒤흔드는 작품들은 절정의 순간에 바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들은 왜 중요한가. 몰락은 패배이지만 몰락의 선택은 패배가 아니다. 세계는 그들을 파괴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한 그 하나는 파괴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면서 이긴다. 성공을 찬미하는 세계는 그들의 몰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 덕분에 세계는 잠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몰락하면서 이 세계의 완강한 일각을 더불어 침몰시킨다. 그 순간 우리의 생이 잠시 흔들리고 가치들의 좌표가 바뀐다. 그리고 이 질문은 본래 윤리학의 질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몰락은 하나씩의 질문을 낳고 그 질문과 더불어 새로운 윤리학이 창안된다. 그러나 한국어 '윤리학'은 다급한 질문보다는 온화한 정답을, 내면의 부르짖음보다는 외부의 압력을 더올리게 한다. 그 뉘앙스가 버성겨서 나는 저 말의 라틴어인 '에티카'를 가져왔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몰락의 에티카다. 온세계가 성공을 말할 때 문학은 몰락을 선택한 자들을 내세워 삶을 바궈야 한다고 세계는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가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문학이 이런 것이라서 그토록 아껴왔거니와, 시정의 의론들이 아무리 흉흉해도 나는 문학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가지런해지던 날 나는 책을 묶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책의 제목은 그때 정해졌고 결국 바뀌지 않았다. 그 책을 이제야 낸다.
(...)
"나에게 비평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고 말할 때 나는 절박하다. 나는 부조리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사람이다. 많은 상처를 주고 적은 상처를 받았다. 이 불균형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 그래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오로지 나의 삶을 나의 글로 덮어버리 위해 썼다. 문학이 아니었으면 정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이것이다. 나는 문학을 사랑한다. 문학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나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것은 나를 지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 나 자신을 위해, 오로지 나의 삶을 덮어버리기 위해서라는 ) 이라는 것이 너무 와닿았다.나는 나 스스로를 부조리하고, 이기적이고, 모순적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내 모습을 통해 슬픔(우울)과 죄책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데, 글이 너무 좋아서 필사하면서 읽었다. 신형철교수님 너무 글을 잘 쓰신다..존경 ㅠ
2019.05.19
나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보기 (가치판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정교한!!!!!언어사용.
무슨 말이 하고싶은지? (주장이뭐냐)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사람 말귀 알아듣게 얘기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