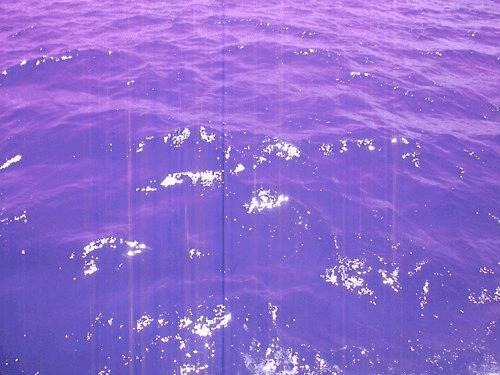sempereadem;
0606: 연극, 극단 돌파구,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본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전인철 연출님 공연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보고 왔다. 홍익대 아트센터 소극장은 처음인듯. 극은 동명의 SF소설을 원작으로 하고있다. 연출님이 SF소설을 극화하시는 작업들이 흥미로워서 다음 것도 기대가 된다.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주제는 너무 어렵지만, 참 재미있는 주제다. 나도 과학-철학-인문학을 연결시키는 고리들을 잘 알면 좋겠다. 김보영 작가님은 독자에게 프러포즈에 쓰일 낭독할 수 있는 소설을 요청받아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프러포즈는 성공적. ㅎㅎ이 소설로 프로포즈하면 누구든 반할 것 같았다. 너무 낭만적!) 원작이 서간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배우 세 분이 등장하지만, 한 번도 대사를 주고받지 않고 독백으로만 진행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 연기하기 힘드셨을 듯.. 근데 연기를 다들 너무 잘 하셨다. (팟캐스트를 통해 들었는데 낭독을 위한 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원작 소설 꼭 읽어봐야지 쿄쿄)
작품은 '무한한 우주와 한 사람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는 긴 시간과 기다림의 의미'로 소개되고 있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 라고 연출 의도에 드러낸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연결지어 작품을 극화하셨다고 한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은 공간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식의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시간과 공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드러내는 대사였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두고 다른 성간을 방문하는 여자에게 삶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남자는 기다림의 배에 탄다. 배를 타고 우주에 머물다 지구에 돌아가면 (지구의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흘러가니까) 다른 것은 변화하더라도 그녀와 자신의 관계는 여전하고, 둘은 같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극에서 기다림이라는 상황을 제외하고 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은 변화한다. 배를 타기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남자가 지구에 도착하자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만 그를 기다린다. 그는 다시 여자를 찾아 작은 배를 타고 우주를 항해한다.
편지 형식이니까 인물이 혼자 대사를 계속 뱉는데 그게 너무 외로워 보였고 애처로웠다. 또 아무리 닿으려고 노력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닿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알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기다림은 계속된다. 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가 존재의 숙명 같기도 하고,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새삼 인간이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공허하기도 하고 슬펐다.
물리적으로 무대는 닫힌 공간이지만, 닫혀있지 않은 우주 공간을 표현한다. 광활하지만 인물은 우주 공간 안에서 고립되어 있다. 공연을 보고 조금 생뚱맞지만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는 물음이 들었다.
우리 삶의 기다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우주 공간에서 서로를 찾아 헤매는 연인의 기다림을 통해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원작도 읽어보고 싶고, 연극적 상상력(무대와 배우를 통해서 3차원의 세계로 끌어온) 연극도 재밌게 봤다.
연출은 무대와 영상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좌우로 긴 무대였다. 벽면 전체가 거울로 마주 보고 있고, 관객도 서로를 마주 본다. 검은색 톤에 바닥도 반짝이는 검은 타일이다. 블랙박스 공간 자체가 우주인데, 관객들은 (내 생각에 떠다니는 별이 아니었을까) 바퀴 달린 의자에 앉고 배우들은 관객들의 사이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스크린에 우주 공간을 표현한 영상들이 나온다. 이전 공연들에서 그랬듯 무대에서 영상을 찍어 배우의 얼굴이 완전히 클로즈업된 상태로 나오기도 한다. 배우가 누워서 유영하는 모습도 윤곽만 따서 영상으로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좀 신비롭게 표현되고, 끊임없는 기다림을 표현하는 움직임이라 좋았다.
공연 중 사용되는 음악은 보이저호에 실어 보내려 했던 비틀스의 노래 ‘Across The Universe’이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추적할 수 없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 헤매고 있을 보이저호의 존재가 연극의 내용과 참 닮아있다. 영화 ‘컨택트’에서 “이 넓은 우주에 인간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다”라는 대사가 기억난다. 나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직 발견을 못 했으니 꾸준히 찾아 헤매는 이 여정이 외사랑 같아서 슬프고 애틋하게 느껴진다. 연극을 보고 종강하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