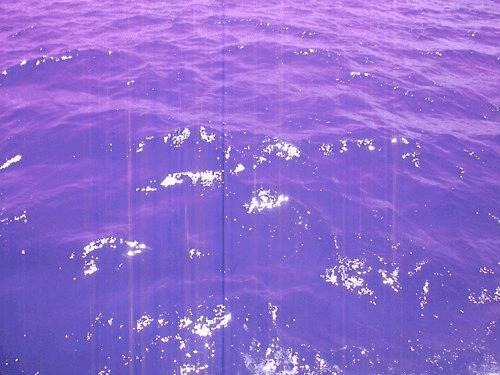sempereadem;
0712 연극 <죽음의 집> 본문
0712 연극 <죽음의 집>
공연장: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블랙박스 상자무대)
작가: 윤영선 , 윤성호
연출 : 윤성호
조연출: 조성욱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노명준
음향디자인: 유옥선
배우 : 이강욱 , 이형훈, 심완준 , 문현정, 백석광, 정새별



밤에 날 집으로 초대한 친구가 사실은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는 공간 ’죽음의 집’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
죽음은 늘 우리의 일상에 만연해 있지만 보통은 스쳐지나가듯 잊혀진다. 나 또한 매체를 통해 많은 죽음은 목격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죽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죽음,삶,기억,관계성 이런 주제 상당히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키워드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좋았다.
연극은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이란 무엇인지 질문하고 남겨진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을 남긴다.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와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이라는 작품의 세팅도 재밌었고. 집이라는 공간에서 베란다를 두고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경계를 표현한 것도 좋았다. 공연의 주제의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공연의 각 요소들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다.
극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강렬하다. 무대와 조명이 특히 인상깊었다. 무대는 집의 거실과 베란다이다. 베란다 창으로 문 밖의 공간(산 자에게는 현실이자 , 죽은 사람에겐 죽은자의 공간)이 보인다. 무대 미쟝센이 예뻤다. 흰색 톤의 미니멀한 무대와 무대 앞과 뒤에 설치된 조명 을 통해서 분위기가 전환된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등 원색의 조명으로 일상적인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환상적인 (경계로써의) 공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천장이 막혀있어서 어디서 조명이 들어오지? 했는데 객석 앞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천장이 막혀있고 바닥이 비치는 재질이라 무대가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인물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상호가 베란다 밖에서 관객을 바라보고 베란다 창에 관객의 얼굴이 비치는게 의미심장했다. 처음 시작할 때 죽은 사람이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들을 표현한 것인지 차도 소리 , 시침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연출,무대,조명,음향 등 각 공연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다.
동욱은 상호가 집 밖으로 나가면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호를 붙잡는다. 초반의 장난끼 넘치던 모습은 사라진다. 극을 볼 때 제3자처럼 봤는데 이때 동욱에게 살짝 감정이입 했다. 우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붙잡고 싶어한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남겨진 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
‘잊혀짐’이라는 공연의 테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다. 잊혀짐이라는 코드가 너무 슬프다. 우린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터뷰에서 조명 디자이너님이 만남이 줄어들고, 그 사람의 기억에 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잊혀짐도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 죽음은 어떻게 보면 잊혀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깊었다. 어쩌면 우린 잊혀지기 싫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공연이 끝나고 기자단 활동으로 창작진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 연출님,무대,조명 디자이너님을 인터뷰 했는데 공연을 보며 궁금해서 기록했던 공연 요소들 하나하나 모두 의도가 반영됐던 것임을 알았다. 창작 과정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뒤늦게 리뷰를 쓰다가 밀란 쿤데라의 ‘향수’ 중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종강했으니 밀란쿤데라. 다시 읽을 책 리스트에 다시 넣어둬야지... 읽을 책이 너무 많은데 손에 잘 안잡힌다. 방학동안 좋은 책 많이 읽고 공부하고 좋은 영화 좋은 공연 많이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