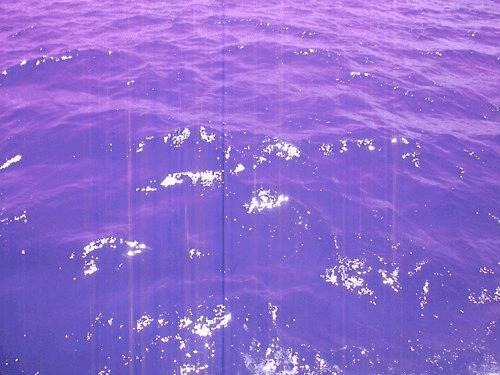sempereadem;
0613: 연극 <FARM> 본문
0613 연극 <FARM>
‘프로젝트 내친김에’ 김정 연출님




1.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블랙박스)
2.소재: 디자인 베이비, 유전자재조합, 생명 윤리
3.연출의도(팜플렛): "너무나 빠르게 질주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의 무서운 질주에 휩쓸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 <FARM>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소외된 한 어린아이 (혹은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을 위해 제 나이의 속도마저 빠르게 감아버린, 너무나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죽음 직전에야 한 순간의 자유를 맛본 '오렌지'에 대한 이야기.
4.주제: 객체로 태어나 그저 도구처럼 이용되며 살아가는 팜도 하나의 존재로서 자유와 욕망이 있다.
Q: 인간의 조건, 객체로 태어나 그저 도구처럼 이용되며 살아가는 팜(신인류)에게도 자유와 욕망이 있는가?/ 또는 팜이 아니더라도 어느새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A: 있다: 죽음 직전 오렌지가 표현하는 욕망
5.무대: 흰색의 원형 무대 안에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있다. 무대 뒤쪽 양 옆에는 거대한 곰돌이 인형, 알록달록한 인형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흰색 톤의 바닥과 가구들. 객석 사이 사이에도 인형들이 올려져 있다.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탄생한 신인류인 ‘팜’ 오렌지의 이야기. 클론의 역할과 비슷하게 팜은 자신의 몸을 단어 의미 그대로 ‘farm’(농장)처럼 자신의 몸에 이식하여 키워내고, 때가 되면 재배한다(적출). 이야기의 설정도 재밌고, 연출 요소도 많고 배우들 연기도 좋으셨다. 하지만 극을 보면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계속 느껴져서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다. 극을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봤다.
우선, 일본 작품이 원작인데 공연으로 봤을 때 캐릭터 설정이나 행동이 굉장히 일본틱하다. 그 특유의 인물묘사나 설정이 주는 괴리감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적으로 각색했어도 애매하고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욕망이 이 극의 주제인 것 같은 이유는 팜은 성욕이 제거된 존재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히 한다는 점.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 전체에 성적인 요소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욕망=인간의 조건, 자유(의지)로 드러난다. 우리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인간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유전자 조합에 대한 문제를 인물을 통해서, 보편적인 주제로 잘 환기한다고 생각했다. 또 인간의 조건과 욕망은 무엇일지도 생각해보게 됨.
‘죽은 직전에야 한순간의 자유를 맛본 오렌지’ 오렌지의 욕망
팜은 성적 욕망이 거세된 상태로 태어난다. 욕망을 거세당했다는 것은 이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음 을 의미한다. 오렌지는 죽음 직전에 한 번의 자유를 맛본다. 오렌지의 (포괄적인 의미의) 욕망은 아버지의 세포를 배양한 뼈를 가지고 마스터베이션 함으로써 달성되는데, 굉장히 프로이트적이다. ㅎ 신기하게도 마지막 장면에서 오렌지와 결혼한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등장한다. 산모에게 유전자 재조합 가능성 없음과 재조합 가능, 처음부터 재조합의 선택지가 주어지며 극이 마무리된다. 연극을 떠나 모든 욕망을 성적인 것으로만 환원하는 것이 너무 프로이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 극의 내용상 신체언어=역동성=살아있음의 표현, 생의 에너지= 욕망 분출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사소한 궁금증: 오렌지는 생물학적 결합(섹스)를 통해 태어나지 않았던 걸까..? 자꾸만 엄마에게 섹스를 원하는 편의점 점장 남자친구는 계속 엄마에게 섹스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한다. 그러다 드랙퀸 마담한테 무슨 이상한 교육을 받고, 갑자기 bdsm내용이 나온다. 엄마 남자친구랑 마담은 뭘까.. 음침한 일본사람? 흠 아무튼 깊게 생각할수록 요상…한데 세상이 이 지경이니까~~
사소한 궁금증2: 그런데 사랑도 보통 성적 욕망으로 표현되니까 그거 말고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은 또 뭐가 있을까. 궁금.. 가장 직관적이긴 하다만. 그동안 본 연극들을 떠올려보면 진짜 대부분 성적 욕망으로 표상됨.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이 존재로서 갖는 자유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성으로만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이 젤 강력한 것인가..?! 의문이 드네.
(프로이트....)
고립된 인물
오렌지라는 주인공보다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가 두드러진다. 오렌지가 주인공이면 당연히 비중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오렌지 외에 가족(엄마와 아빠), 엄마의 남자친구, 마담, 케이타에게 죽은 강아지의 눈을 이식시킨 할머니가 등장인물이다. 극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던 것인지 쉽게 감이 안 왔다. 오렌지의 엄마와 아빠는 무심할 정도로 오렌지를 챙기지 않고, 아빠는 무슨 자기 아들한테 장기를 배양하게 하여 돈이나 벌고 가정에 무심한 나쁜 놈이다. 이러한 내용은 오렌지의 시점이었는지 궁금.
연출요소
원작자 마츠이 슈 연출 버전에서 <팜>은 차가울 정도로 고요한 일상극이라고 한다. 공연소개 보면, 연출님은 희곡에 아주 충실하면서도 정반대의 표현법을 썼다고 한다. 텍스트 자체는 조용한 슬픔을 다루는데, 실제로 연출 요소로 움직임, 과장된 대사처리, 의상들, 화려한 조명, 음악이 사용된다. 가장 두드러진 연출요소는 움직임인데, 사실 움직임들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 무용수 출신 배우분이 나오셨던 <처의 감각>도 그러하고 연출님의 공연을 5편 이상 본 결과 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김정 연출님은 어떤 의도를 담은 움직임을 통해 극을 끌어나가려고 하시는 걸까? 궁금했다.
공연의 테마곡 ‘My Way’
오프닝부터 음악이 반복되어 사용된다. 노래의 가사를 '죽음'으로 끝나는 이 극의 결말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극이 죽음-삶-욕망…. 뭐 이런 내용이니 아래 가사가 그런 주제를 함축한다고 생각한다.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augh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추가적인 생각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연극을 보고 앤드류 가필드, 캐리 멀리건, 키이라 나이틀리가 나온 ‘네버 렛 미 고우’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클론으로 태어나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클론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 주인공들이 학교에서 내내 열심히 그림을 그려 ‘갤러리’라는 곳에 보냈다.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면, 장기기증을 유예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주인공은 교장을 찾아가 갤러리에 그림을 보낸 것을 이야기한다. 교장은 그것은 인간 사회가 클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실험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헤일셤에서 예술을 통해 마지막으로 클론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려고 했다. )클론에게도 인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였지만,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듣는다. 영화의 결말로서 초반의 세팅 그대로 인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기기증 = 죽음이다. 무튼 , 연극을 보고 이 영화가 떠올랐다. 또 인간다움 .. 미래에는 (객체가 아닌, 주체에 해당하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늘까?